| 이산해(1539∼1609) | |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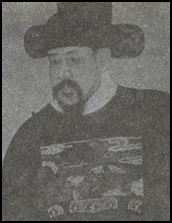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이지번이 1539년(중종 34)에 사신으로 갈 때 산해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날 밤 집에있는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꿈을 꾸었다. 꿈이라지만 생시처럼 너무도 생생한지라 이상히 여기고 있다가 중국에서 돌아와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부인도 같은 날 밤 똑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은 그날의 꿈으로 부인이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리하여 집안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남편없는 사이에 생긴 아이라 하여 의심한 나머지 내쫓으려 했는데 이때 남편 이지번이 꿈꾼 이야기를 하니 이 아기의 삼촌되는 토정 이지함이 극구 말렸다. 이지함이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고고한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가문을 빛낼 자가 지금 이 아이이니라." 하며 기뻐했던 것이다. 그런데다, 아이가 차차 자라면서 꼭 아버지를 닮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낮에도 그림자가 없었으므로 부인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해관에서 꿈을 꾸고 낳았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산해'라 지으니 이가 곧 조선중기 문신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제천시 수산면 출신이다.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란 걸 안 토정 이지함은 5세 때부터 학문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책을 읽는지 침식을 잊을 정도라 했고, 6세 때에는 능히 붓글씨를 쓰니 모두들 그를 신동이라 칭했다 한다. 1558년(명종 13) 19세로 진사가 되고 3년후 22세 때엔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에 홍문관 정좌로 벼슬길에 들었는데 이때 명종의 명을 받고 경복궁의 현판을 썼다. 이어 부수찬이 되고 1564년부터 그는 병조좌랑, 수찬, 이조좌랑을 역임했으며 1567년(선조 즉위년)엔 원접사 종사관으로 명나라 조사랄 맞이하고 그후 이조정랑, 의정부 사인, 사헌부 집의, 상의원정, 부교리, 직제학, 교리, 응교를 거쳐 동부승지와 이조, 예조, 형조, 공조의 참의를 차례로 역임하고 대사성, 도승지가 되었다. 그는 벼슬을 옮길 때마다 그곳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썼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게 되면 자기 가족처럼 대하였으며 구하지 못하면 밤 늦도록 또는 등불을 밝힌 채 골똘히 인재 발굴의 생각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바쁘게 일을 처리하였다. 또 자신이 관장하는 정사에 어찌나 빈틈이 없고 정확했던지 감사관이 종일 검열하여도 한치의 착오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다. 그리하여 "정사가 이와 같이 완벽하면 누군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철두철미한 업무 관장에 경탄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렴결백하기 이를 데 없어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감히 그에게 청탁을 하지 못했다. 1578년 그가 대사간이 되었을 때 조정의 파벌 싸움은 극에 달해 도인, 서인의 대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동인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쪽이었는데 이때 사건 하나가 터졌다. 즉 진도군수 이수라는 사람이 서인인 윤두수, 윤근수 형제와 이들의 조카인 윤현네 집에 뇌물로 쌀 얼마를 갖다주었다는 말을 동인인 김성일이 선조왕이 참석한 연회 자리에서 폭로한 것이다. 이 사건을 이산해가 맡았다. 그는 당시 서인을 이끌던 정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3윤, 즉 윤두수, 윤근수, 윤현을 파직시켰다. 이듬해 대사헌에 승진되고 1580년 병조참판에 이어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찬성에 차례로 오르고, 다시 또 이조, 예조, 병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제학, 대제학,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를 겸하였다. 그리고 1588년 영의정 노수진이 추천하여 우의정이 되었는데, 이 무렵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우두머리로 정권을 잡았고,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3등으로 올라 아성부원군에까지 책봉되었다. '종계변무'란 조선왕조의 조상이 명나라 서적에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치려고 청한 일을 말하는데 즉, 조선이 세워지고부터 1584년(선조 17)까지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조선왕조의 태조가 고려의 실력자 이인임의 아들로 실려 있어 바로 잡아 줄 것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다가 선조 17년에 다시 고쳐 줄 것을 요구하는 사신으로 황정욱 등을 보내어 마침내 그것을 고쳤고, 1588년(선조 21)엔 고쳐진 「대명회전」을 유홍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에 선조가 이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빛내는 데 공을 세운 신하라 하여 등급을 매겨 '광국공신'의 칭호와 함께 벼슬을 내린 것이다. 그 다음해 그는 좌의정에 오르고 이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러니 그에 대한 선조의 신망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산해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으며 옷입는 맵시는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면에 충실하다. 그를 보면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했으며, 한 신하가 왕께 아뢰기를 "한 사람이 오래도록 권세를 잡고 있으면 권세가 편중될 염려가 있사옵니다." 했을 때 "경(이산해)은 나의 사직의 신하라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고 노하며 그를 꾸짖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591년(선조 24)에 정철의 건저 문제가 일어났다. 즉 좌의정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하자 이산해는 왕의 뜻은 신성군에 있음을 알고 정철의 계획을 신성군의 외삼촌인 김공량에게 말하고 김공량은 신성군의 어머니인 인빈에게 말하고 인빈은 또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선조가 노하여 물의가 일어났다. 이에 다시 그는 아들 경전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하게 하여 강계로 귀양을 가게 하고 서인의 우두머리급들을 파직 또는 귀양 보내에 동인의 집권을 튼튼히 했다. 이듬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전세가 불리하여 조정에서는 서울을 지키자는 쪽과 의주로 피난을 가자는 쪽으로 갈라졌다. 이때 선조는 이산해의 주장에 따라 의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개성에 왕의 몽진행차가 다다랐을때 그의 탄핵문제가 일어났다. 동인이, 서인이 예고한 왜란을 무시하여 이렇게 왜적이 침입하게 되었다는 것과 서울을 포기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 탄핵을 한 것이다. 이에 그는 부득이 유성룡과 함께 벼슬에서 물러나 백의로 평양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또다시 전날의 문제를 가지고 탄핵하여 벌로 다스릴 것을 거듭거듭 주청하니 왕도 부득이 "중론이 그러하니 경은 당분간 휴식하라." 하고 평해로 유배시켰다. 과연 선조는 3년 후인 1595년에 그를 다시 영돈녕부사로 복직시키고 대제학을 겸하게 했다. 이즈음 동인에서 갈려나온 북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는데 그는 대북의 우두머리로서 1599년 또다시 영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또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1601년 그는 부원군에 봉해졌는데 선조가 죽자 원상(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는 직책)으로 국정을 맡았다가 1609년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실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그는 특히 문장에 능하여 선조조 문장팔가의 한 사람으로 불렸으며 서화에도 능하여 대자와 산수묵도에 뛰어났으니 용인에 있는 조광조 묘비와 안강에 있는 이언적의 묘비는 그가 쓴 것이다. 저서로는 그의 호를 딴 「아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이다. |
|---|---|
- 이전글 정철(1536∼1593)
- 다음글 신잡(1541∼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