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1376∼1451) | |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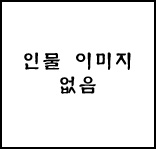
1376년 해뜨는 나라 동방 한반도에 세계적인 과학자의 탄생을 알리는 고고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서양보다도 200년이나 앞선 측우기의 발명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세종 때 무인으로서도 이름을 떨친 이천이다. 자라면서 이미 그는 양 방면에 특출함을 보였다. 병정놀이를 좋아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야릇한 무기를 들고 나와 싸우는 바람에 당해 낼 상대가 없었다. 그 무기는 날마다 새로 바뀌는 것이었다. 병정놀이를 못하는 저녁에는 집에서 밤늦도록 신무기를 제조했기 때문이다. 무기뿐 아니었다. 동네의 농기구며 대장간의 풀무에 이르기까지 소년 이천의 손에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불편한 것은 개량까지 해서 사용법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부친이 군부판서까지 지낸 집안이라 학문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그의 이름은 그가 사는 시골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퍼졌다. 그리하여 그는 1393년(태조2년)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별장에 임명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402년(태종2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1410년에 무과 중시에 거듭 급제하여 주로 병기연구와 제조에 종사했다. 그러다가 1420년(세종 원년) 동지총재로 있을 때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워 경상·충청의 양도병마도절제사가 되었으며 이때에는 병선을 만드는 일에 힘썼는데, 이로 인하여 그는 정식으로 연구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곧 무인으로서 무예를 닦는 틈틈이 여러 기계장치의 원리를 더욱 깊게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이다. 특히 금속공예와 그 주조법에 일가견을 이루어 세종은 그를 공조참판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청동활자인 경자자를 만들게 했으니 인쇄능률에 있어 단연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글자체는 원판본을 이용한 것으로 글자 모양이 작고 그리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빠른 인쇄속도가 요구되어 다시 주조사업을 시행, 1434년(세종 16년)에 완성한 것이 곧 갑인자이다. 이 갑인자는 그가 지중추원사로 있을 때 대제학인 김돈과 함께 만든 것으로 20여만 개의 크고 작은 활자로 만들어졌으며 경자자보다 글자 모양이 아름답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큰 활자와 작은 활자를 필요에 따라 섞어 조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후 정초, 장영실, 김빈 등과 함께 수년간 노력하여 천문 관측 기기인 간의,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등도 만들었다. 1432년(세종 14년)에 만든 간의는 일종의 각도기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기계로서 적도면을 360도 4분의 1로 나누어 동서로 운전하고, 12시 100각을 새겨 놓은 것인데, 경회루 북쪽의 간의대에 설치한 '대간의'와 휴대용 '소간의'가 있었다. 1434년(세종 16년)에 만들어진 해시계는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로서 일명 양부일영(구) 이라고도 하는데, 흠경각에 처음 설치했고 서울 혜정교와 종묘 앞에도 두었다. 1438년(세종 20년)에 만들어진 물시계는 '자격루'라 하는 것으로 나무로 되었으며 모양은 동자인형(어린이 모양)으로 보루각에 보관하였으며, 그 곳에는 3신과 12신이 있어, 3신은 각각 시간을 맡아 종을 치고, 경을 맡아 북을 치고, 점을 맡아 징을 쳤으며, 12신은 시패를 맡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시간을 알렸다. 1442년(세종 24년)에 만들어진 측우기는 강우량을 재는 기구로 서울에는 서운관(관상대)에 쇠로 만든 것을 설치하여 관원으로 하여금 우량의 깊고 낮음을 측량·기록하게 하고, 지방에는 관아의 뜰에 설치하여 수령이 직접 측정·기록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가스텔리(Gastelli. B)가 1639년에 만든 서양의 것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밖에도 이천은 훈의, 규표, 종경, 천구의, 천문력상, 사신 옥루 등의 천문 관측기도 만들었는데 모두 그 규모가 정밀하였다. 한편, 무인으로서 그는 1436년(세종 8년)에 평안도 도절제사가 되어 비변사를 겸임하면서 평안도 변방 여진족의 침략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 고려말부터 시작된 평안도 북방 여진족의 침입이 세종 때 갑자기 잦아지자 1433년(세종 15년) 최윤덕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김효성을 도진무로 임명하고 1만 5천여 군사를 출정시켜 반격, 토벌했다. 이때 자작리(현재의 자성)에 성을 쌓고 자성군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면에 대한 여진족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세종은 당시 평안도 도절제사인 이천에게 이들은 다시 평정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1437년(세종 19년) 그는 8,000명의 군사로 토벌에 나섰다. 그리하여 압록강을 건너 오라산성(현재 5녀산), 오미부 등 그들의 소굴을 무찔러 마침내 평정했다. 평정한 후 또 다시 여진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4군을 두어 북방을 튼튼히 할 것을 세종께 건의하였는데 세종대왕은 이를 받아 들여, 아연, 자성, 무창, 우예의 4군을 설치하였다. 그는 그후 함경도 도절제사로 전보되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동북 방면인 함경도 북방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임무였다. 그런데 그때, 여기엔 김종서가 1434년부터 국방상 요지로 주목하여 두만강 하류 남안에 6진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김종서와 같이 이곳에 종성·은성·회령·경원·경흥·부령의 6진을 설치하여 북방을 튼튼히 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이 동북방면의 6진 개척은 서북방면의 4군 설치와 함께 세종의 훌륭한 업적 중의 하나려니와 이를 이룩하는데 참여한 이천의 공 또한 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제철 기술을 눈여겨 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무쇠를 연철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서 부족한 구리 대신에 쇠로 대포를 만들어냈다. 그 뿐이 아니었다. 병선을 만드는 데에도 판자와 판자를 이중으로 붙이는 방법인 갑조병을 연구하여 제조할 것을 건의하는 등 실로 과학적이고도 실질적인 일에 온 힘을 쏟았다. 1450년(세종 32년)에 지중추원사가 되고, 1451년(문종 원년)엔 판중추원사가 되어 군국중사의 큰 공으로 일품에 오르고는 그해 76세로 세상을 떠나니, 조정에서는 3일간 업무를 중단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묘소는 보은군 외속리면 구인리에 있다. 시호는 '익양'이다. |
|---|---|
- 이전글 권근(1352∼1409)
- 다음글 하연(1376∼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