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탁(1262∼1342) | |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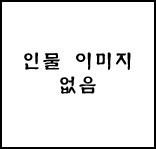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국어 교과서에서 낯이 익은 우탁의 시조 2수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인데 서글픔이 느껴지는게 아니라 미소를 그치지 않게 하는 재치가 있어 재미 있다. 이것은 인생 달관에서나 우러날 수 있는 도인다운 여유일 것이다. 어린 소년의 학문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고 거기서 우러난 행동 거지가 어떻게나 밝았던지 이미 학자의 학식과 군자의 품성을 갖췄다고 하여 과거에나 합격해야 주어지는 진사라는 벼슬 칭호를 15세 난 어린 소년에게 붙여 주었다. 처음에 그는 벼슬에는 별로 뜻이 없었다. 그러다가 1290년(충렬왕 16) 그의 나이 27세로 과거 에 합격하였는데 처음 벼슬로 사록이라는 관직을 받고 지금의 경북 영덕군에 있던 영해 라는 곳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부임해 보니 이곳에 팔령이라고 이름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 주민들이 이 영험을 믿고 팔령신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팔령신이란 이름 그대로 여덟의 방울신을 일컫는데 이들에게 재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얽매여 힘겹게 재물 을 바쳐야 하는 주민들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유학에서는 민간신앙인 이러한 미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철저한 유학자인 우탁이 이를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는 이 팔령신을 타파하는 데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전한다. 그 하나가 여덟개의 방울을 만들어 그것을 부수어서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팔령신을 현지에서 구전되는 것으로, 여덟신 중 일곱을 없애고 나머지 하나마저 없애려 하자 살려 달라고 싹싹 비는데 보아하니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호호한 백발의 가련한 할미라 이를 살려 주었더니 이 신이 지금의 당고개 서낭이 됐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우탁에 관한 인물전설이 '우탁설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전해 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한 유학자로서 폐해가 컷던 미신 타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우탁은 주역의 이치에 능한 사람이었다. 주역은 일명 「역경」이라 하는데 약칭으로 그냥 '역'이라고도 한다. 역경은 유교 경전「시경」,「서경」,「역경」, 「예기」,「춘추」중 가장 어려운 경서로 꼽는다. 괘를 따져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에 능하면 길흉을 점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역학자니 역술가니 하는 사람 들이 점치는 사람들로 통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주역의 이치를 깊이 공부한 우탁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역학자였으며, 또 이를 넘어서 도술까지 터득했다고 한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우탁이 "네 이놈들 계속 그렇게 기승을 부리면 멸종을 시킬 것이니라." 하고 글을 써서 개구리들에게 보내니 동헌으로 개구리들이 떼로 몰려와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이야기가 호랑이가 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런 방법을 써서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한 해에 우탁은 감찰규정이란 벼슬에 올랐다. 이 관직은 정치를 비판하고 모든 관리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억울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일을 맡아하는 것인데 곧고 정직한 성품에 높은 학문을 갖춘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통례 였다. 마침 이때 충선왕이 부왕(왕의 아버지)의 후궁인 숙창원비와 가깝게 지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아버지의 둘째 부인되는 사람을 가까이한 것이었다. 이에 우탁이 백의 차림으로 도끼를 들고 거적자리를 짊어지고 결연히 대궐로 들어가 극력으로 간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며 상소를 읽어 올리는 신하가 상소를 펴 들고는 감히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걸 보자 우탁이 낯빛을 엄히 보이며, "경이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로서 왕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악으로 인도하여 이에 이르니 경은 그 죄를 아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 꾸짖으니 좌우에 있던 대신들이 크게 놀라고 왕도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였다. 그 뒤 우탁은 훌훌히 관직을 떠나 향리로 내려가 학문에 정진하였는 데 충숙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여러번에 걸쳐 우탁을 불렀다. 그러나 거절하다가 다시 벼슬길에 올라 성균관 좨주라는 지금의 최고 국립종합대학의 세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상위관직(정3품)을 맡았고 나이가 들자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우탁이 일찍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중국의 천자가 그에게 역을 내려주었다. 그리하여 그 곳 학자들과 역을 읽으며 그 이치에 대한 의문을 서로 토론할 때 그의 밝은 지식과 정연한 이론 전개가 그들보다 앞서 있음을 보고 크게 놀라 '아하 우리의 역은 동(고려)으로 갔구나'하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실로 통쾌한 일이거니와 이로부터 '역동선생'이라 칭하게 되고 역동을 호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조에 이퇴계의 발의로 1570년에 선생을 기리는 역동서원이 예안에 창건되었으며 그후 안동에 구계서원, 영해에 단산서원, 그리고 단양에 단암서원이 세워졌다. 선생의 고향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에 있는 사인암이란 이름은 그가 사인이라는 벼슬에 있을 때 그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쉬었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것이다. 1342년 선생이 7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650여 년 후인 1977년 여기에 선생을 기리는 「역동선생 사적비명」이 한학자 이가원씨의 글로 세워졌다. "이 세상 학문의 으뜸인 유경 중에서도 특히 역과 홍범(중국 서경의 1편)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기자가 (홍범을) 가져온 것은 아득하나 역이 동으로 전해 온 것은 사실이 극히 명백하다. 좨주, 우선생은 왕씨 고려조의 선비로서 적막한 천 년 동안 아름다운 이름을 독점하였다." 는 문구가 들어 있다. 선생의 묘가 있는 안동 정정리엔 유허비가 있다. |
|---|---|
- 이전글
- 다음글